글 이준섭 문화칼럼니스트
작년 에세이집 『교도소에 들어가는 중입니다』를 출간한 현직 교정공무원 김도영 작가가 올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룸 2.58』로 다시 돌아왔다. 교정공무원으로서 겪고 느낀 일들을 생생하게 전하는 그의 문장에는 사람에 대한 의문과 회의, 직업적 어려움 등이 면면히 녹아 있다. 그럼에도 그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우리 모두에게 읊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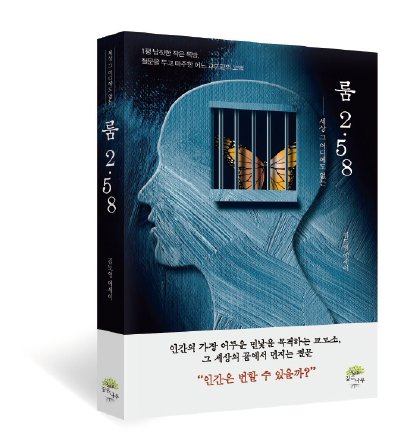
시간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전국이 사계절을 맞이하고 떠나보낼 때, 교도소도 똑같이 헌 계절을 보내고 새 절기를 들인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결은 바깥세상과 사뭇 다르다. 죄를 지은 수용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부대껴 살아가며 서로 으르렁거리기 일쑤고, 뭔가 제 뜻대로 안 되면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진정과 고소를 제출한다. 수용동에 투입된 교정공무원은 1백 명 내외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정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교정교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때때로 벌어지는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 때문에 교도소의 사계절은 그야말로 정신없이 돌아간다.
현직 교정공무원인 김도영 작가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룸 2.58』(이하 룸 2.58)의 목차를 봄·여름·가을·겨울 등 네 갈래로 나눴다. 교도소의 사계절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독자들을 가상의 교도소 복도로 안내한 그는 교도소 특유의 가라앉은 분위기와 묘한 한기, 여느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갖가지 사건들을 정밀화 그리듯 세세하게 묘사한다.
교정공무원으로서의 감정 변화와 이 일을 통해 느끼는 온갖 상념도 사건을 따라 이리저리 굽이친다. 언제나 만실(滿室)인 수용동을 순찰하고 거친 수용자들을 맞닥뜨릴 때는 ‘인간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하는 자문에 빠졌다가도 출소 후 인생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수용자들을 바라보며 새삼 교정교화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 아마도 김도영 작가는 오늘도 두 생각 사이를 분주히 오가고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김도영 작가가 그리는 교도소의 봄은 만물이 소생한다는 그 시기와 달리 삭막하다. 수용자의 방을 검사하며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벌인다. 24시간 근무의 피곤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수용자들을 지켜보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격언에 물음표를 붙이기도 한다. 수용자들이 무언가를 요청할 때 울리는 알람과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울리는 비상벨은 그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교도소 생활의 퍽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고 있을지도 모를 독자를 위해 그는 소리 내어 외친다. “님아, 부디 이 문턱을 건너지 마오!”
30℃ 넘는 열기와 온갖 냄새가 뒤엉키는 교도소의 여름은 읽는 것만으로도 푹푹 찌는 기분이다. 백화점에서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는 직원을 통해 감정 노동자로서의 교정공무원의 노고를 떠올리고, 여름 특집 기사에 실을 교도소 괴담을 들려달라는 한 기자의 요청에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답니다’라는 답변을 차마 내뱉지 못하고 꿀꺽 삼킨다.
가을만큼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기 좋은 계절이 또 있을까. 김도영 작가도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사색에 잠긴다. 그리고 그 끝에서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오히려 드라마와 영화로 인해 휘어지고 뒤틀린 교정공무원의 ‘진짜 모습’을 글로 써서 내보이고 이를 통해 교도소의 인력난, 과밀 수용 문제 등에 대한 세상의 관심과 변화를 이끌겠다고 결심한다. 덕분에 김도영 작가는 책을 낼 수 있었고 우리는 『룸 2.58』을 읽을 수 있었으니, 가을은 나름대로 우리 모두에게 큰일을 한 셈이다.
『룸 2.58』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제4장 ‘교도소의 겨울’이다. 지난 계절과 별다를 것 없는 나날이지만, 그럼에도 김도영 작가는 인간성에 대한 믿음과 직업적 소명의식을 서서히 회복한다. 한 강연에서 호기심 가득한, 그래서 때때로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갖가지 질문들을 지나 교정공무원 선배의 자녀가 건넨 한마디 ‘교도관 일 많이 힘들죠?’에 큰 위로를 받고, 가족과의 내일을 그리는 수용자들의 다짐과 노력을 발판 삼아 교정교화의 길로 한 발 더 나아간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오듯, 김도영 작가도 가장 근무하기 힘든 겨울에 내일의 따뜻한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을 살아간다.
그는 교정공무원의 어려움을 세상에 알리는 데에도 지면을 아끼지 않는다. 많은 교정공무원이 인력난, 수용자로 인한 봉변 등으로 인해 심신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세상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아울러 전국의 교정공무원 선후배들과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와중에도 끝까지 책을 놓지 않은 독자들에게 아래의 마지막 문장으로 뜨거운 진심을 전한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전국 만 칠천여 명의 교도관들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길, 그리고 제 청원의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