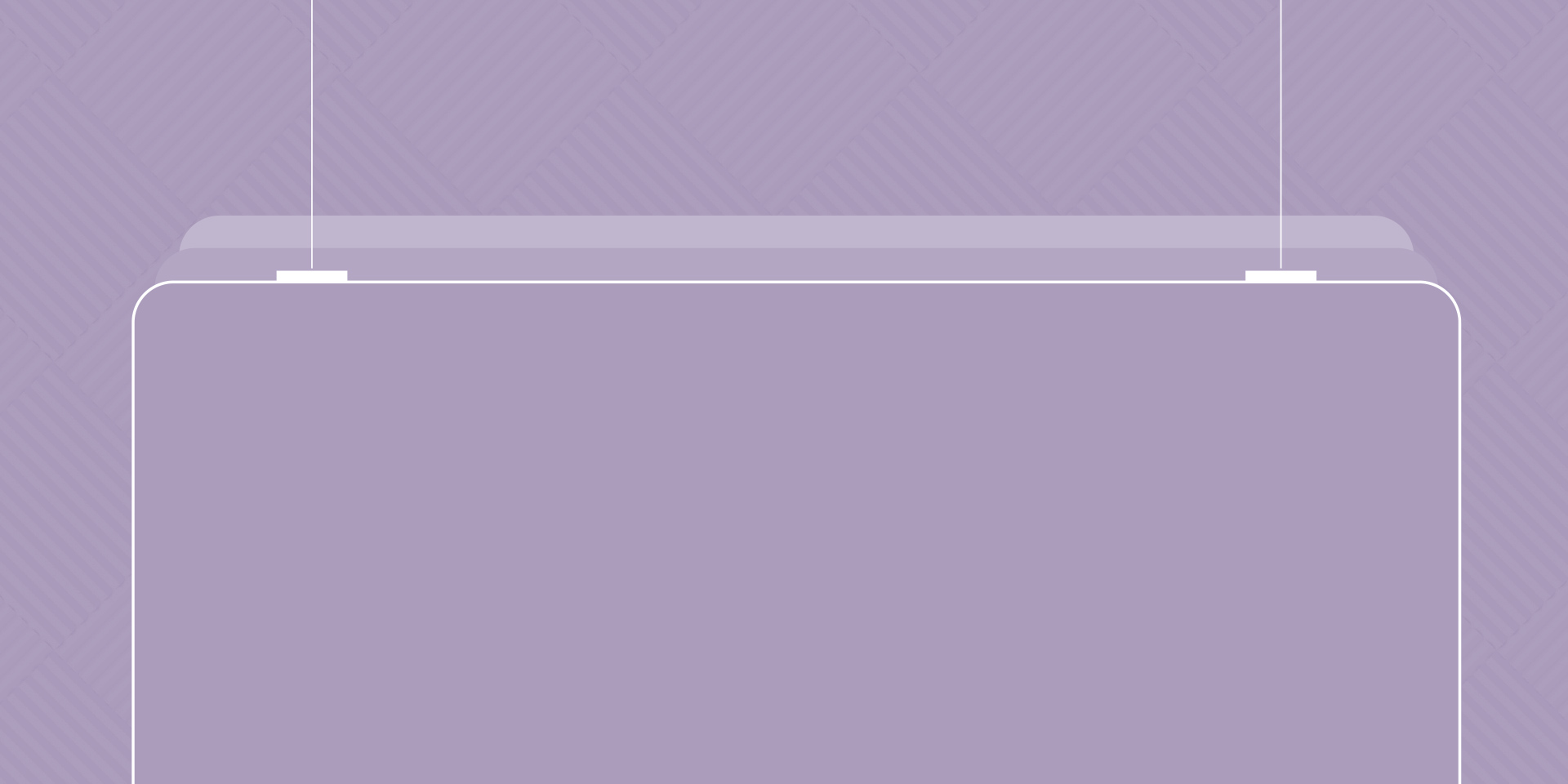교정 리포트
가석방제도 개선을 위한 형기단축제도
(Good Time System)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과밀수용 해소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7년부터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써 가석방제도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에 대해 형법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객관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의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등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요인 중 처벌 경험과 관련한 지표들은 이미 형기에 반영되어 있으며, 입소 전 경제·거주상태 등의 보호 관계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이미 수형자의 여건에 해당하므로 재범 위험성의 지표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가석방제도는 영·미식의 행정처분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의 조기 석방 방식 중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를 제외한 채 가석방제도만을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형기단축제도의 주된 선정 기준은 교도소 내의 작업성적·교정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교도소 내의 선행 등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수형자 스스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적극적인 교정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높이며, 봉사활동·선행을 통해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써 의미 있는 기준이라 생각된다. 이 제도를 보호관찰의 엄격한 적용을 조건으로 시행하여 선시 크레디트의 취소와 실효제도를 마련한다면, 가석방의 평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가석방제도와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병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 주제어 : 교도소 과밀수용, 가석방제도, 가석방 대상자의 실질적 요건, 가석방 대상자의 기준, 형기단축제도
Ⅰ. 서론
우리나라 교도소의 수용인원은 4만 명 수준에서 유지되어 오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5만 명 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1) 2024년 법무부에서 발간한 「2024년 교정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23년 교정시설 전체 수용 정원은 4만 9,922명임에 반해,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만 6,577명으로 수용 정원 대비 수용인원은 113.3%에 이르고 있다.2) 이러한 과밀수용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수용 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3)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해소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4) 이에 따라 2017년 부산고등법원에서 최초로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동일 취지의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5)
이러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헌법상 보장된 수용자의 권리는 물론,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 활동을 제약하고, 각종 교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가석방의 활성화를 통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가석방제도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물론 가석방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법률적 성격이나 대상자의 선발기준 또는 심사 과정에서의 정당성, 재범 예측의 타당성, 심사기관의 이원적 체계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6) 정기형 제도의 결함에 대한 보충, 올바른 수형 생활의 유도, 수형 시설 내의 질서유지, 교정 효과의 상승, 재범의 방지, 과밀수용의 해소 등 많은 장점을 보유한 제도이다.7)
가석방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미군정시대에 ‘우량수형자 석방령’을 제정·시행하였으나, 1953년 형법을 제정하면서 가석방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다.8) 그러나 미국의 기결수형자 석방과는 다른 형태로 정착하게 된다. 예컨대 미국의 기결수형자 석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우리의 가석방 형태와 같은 가석방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가석방 둘째, 전체 형기에서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적용을 제외한 기간의 경과로 인해 가석방되는 ‘필요적 가석방’ 셋째, 기타 조건부 가석방 넷째, 만기 출소이다.9) 이중 현재 우리나라가 채용하지 않는 형기단축제도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는 물론, 독일과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채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가석방제도와 함께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를 병행하는 것은 가석방제도가 가진 한계를 형기단축제도를 통해 보완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형기단축제도는 교도소 과밀인구를 조절하고, 선행을 장려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교도소 내에서 만든 제품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석방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가석방제도가 과거에 범한 범죄와 돌아갈 곳의 생활환경 등 재범의 우려에 주목하는 반면, 형기단축제도는 자신의 개선 의지와 노력에 주목한다. 물론 형기단축제도가 가진 단점도 많겠지만, 일선 교정시설의 실무자들을 통해 많이 주장되는 이 제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10) 이에 이 논문은 가석방제도와 형기단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두 제도가 서로를 보완하며 병용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형기단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리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는 운영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1) 정윤숙 외, (2023), 「2022 범죄백서」, pp.344, 법무연수원.
2) 법무부, (2024), 「2004 교정통계연보」, pp.63, 법무부 교정본부.
3) 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헌법재판소 2023.02.23. 선고 2021헌마16 결정; 헌법재판소 2024.01.25. 선고 2022헌마150 결정 등.
4) 이성호 외, (2017), 「구금시설 과밀수용과 수용자 인권토론회」, pp.6 이하, 국가인권위원회.
5) 부산고등법원 2017.08.31. 선고 2014나50975 판결; 대법원 2022.07.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등.
6) 이정봉, (2004), ‘현행 가석방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제24집, pp.360,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7) 김선태, (2017), ‘가석방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교정연구 제27권 제2호 (통권 제75호), pp.31, 한국교정학회.
8) 김선태, 앞의 글, pp.33.
9) 이희정, (2021), ‘가석방제도의 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정연구 제31권 제1호 (통권 제89호), pp.22, 한국교정학회.
10) 장영민/탁희성, (1993), 「가석방의 실태와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pp.19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II.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과 해소 방안
1.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
우리 교정 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밀수용과 관련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11) 예컨대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12년 45,488명이었다가, 2014년 50,128명으로 증가하여 5만 명대에 진입하였고, 2017년 57,29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 현재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6,577명에 이르고 있다.12) 이처럼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는 교정 정책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13) 교정시설의 수용밀도가 높을수록 수용 사고의 발생 건수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14)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교정시설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보수화와 범죄자에 대한 강경한 대처와 응징을 요구하면서도,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의 집행에는 소극적이라는 문제이다.15) 따라서 과밀수용 문제는 조만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여건 내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11) 김선태, 앞의 글, pp.35.
12) 법무부, 앞의 책, pp.63.
13) 김정연 외, (2019),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p.7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 Peter L. Nacci, Hough E. Teitelbaum, & Jerry Prather, (1977), ‘Population Density and Inmate Misconduct Rates in Federal Prison System’, Federal Probation, vol 41;27.
15) 이윤호, (2021), 교정학, pp.91, 박영사.
1) 1일 평균 수용인원 중 미결수용자의 비율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4만 명대를 유지해 오다, 201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증감을 이어가면서도 꾸준히 5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미결수용자의 수를 살펴보면, 2012년 14,186명에서 2016년 2만 명대로 진입한 후 증감을 이어오다 2022년 현재 17,736명을 기록하고 있다. 미결수용자는 2009년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재판이 확대되면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전체 수용자의 30% 중반대를 이어가고 있다.16) 이러한 미결수용자의 비율은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2016년 일본의 미결수용자 비율은 전체 수용인원의 10.6%에 불과하다.17) 그러나 일본도 우리처럼 과밀수용의 문제를 경험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신설하고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향했으며, 기소유예를 확대 적용하는 등 미결수용자의 비율을 감소시켰다.
16) 정윤숙 외, 앞의 책, pp.343 이하.
17) 이희정, 앞의 글, pp.13.

2) 가석방 허가자 집행률 현황
지난 10년간(2012년~2021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가석방자 70,672명 중 형 집행률이 50% 미만은 39명으로 0.1%, 60% 미만은 15명으로 0%, 70% 미만은 168명으로 0.2%, 80% 미만은 8,956명으로 12.7%, 90% 미만은 41,782명으로 59.1%, 90% 이상은 19,712명으로 27.9%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가석방 대상자의 형 집행률은 80%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정시설 과밀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우리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에 대해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경우,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18) 이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한 형기 이수 기간을 무기징역의 경우 15년으로, 유기징역의 경우 4분의 1을 경과 한 후로 개정하자는 견해도 있지만,19) 우리 형법이 가석방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가석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선고형의 3분의 2가 경과 한 후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된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4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 한 후, 4년 이상의 장기수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후 가석방할 수 있다.20) 따라서 법률상의 문제이기보다는 가석방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21)
18) 형법,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참조.
19) 김준성, (2013), ‘가석방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제6권 제3호, pp.277,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 남선모/이인곤, (2014), ‘현행 가석방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53호, pp.244 이하, 한국법학회.
21) 류병관, (2019),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제56회 한국교정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pp.10 이하, 법무부; 남선모/이인곤, 앞의 글, pp.254.
3) 출소자의 재복역률 현황
수형자가 출소한 후, 3년 이내 또다시 교도소에 수용되는 ‘출소자 재복역률’의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평균을 살펴보면, 형기 종료의 경우 30.9%, 가석방의 경우에는 7.4%를 나타내고 있다.22)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만기 출소자의 재복역률에 비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이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은, 가석방되고자 노력하는 수형자와 그렇지 않은 수형자의 향후 삶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석방이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범죄 수별 재복역 인원 현황’을 확인해 보면, 초범의 경우 10.6%, 2범의 경우 25.9%, 3범의 경우 39.3%, 4범의 경우 46.6%, 5범 이상의 경우 58.8%를 나타내고 있다.23) 이 통계를 통해 교화·개선이 효과적이지 못하며, 초범의 경우 가석방을 확대하여 교도소 내의 악풍감염과 부문화 접촉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같은 기간 ‘죄명별 재복역 인원 현황’을 확인해 보면, 절도죄의 경우 46.3%,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44.7%로 타 범죄에 비해 월등하게 재복역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24) 이를 통해 수형자들이 교화·개선되지 않은 채 사회에 복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절도죄의 경우 생계형 범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생계 문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채 사회에 복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정윤숙 외, 앞의 책, pp.175.
23) 교정기획과, (2023), 「2023 교정통계 연보」, pp.178 이하, 법무부 교정본부.
24) 교정기획과, 앞의 책, pp.180.

2. 교도소 과밀수용의 해소 방안
교정(矯正)이라는 용어는 대상을 ‘바르게 고친다’라는 목적 지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교정은 수용자의 구금을 통해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응보·일반예방·특별예방 등을 추구하지만, 교화·개선을 중시하며 이를 우선하여 추구하는 현대 교정 이념을 담고 있다.25) 그러므로 불필요한 구금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석방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가석방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꾸준한 지적과 교정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허가자의 형 집행률이 아직도 높은 것은 범죄자 가석방에 대한 국민적 법 감정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미흡하고, 가석방 심사기관이 사회 방위적 측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사회 내 처우 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가석방제도가 가진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26) 그러나 교도소 과밀현상의 해소와 수용 능력 통제는 가석방이 주는 부수적 효과에 지나지 않으며, 주된 기능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27)
25) 이백철, (2020), 교정학, pp.5, 교육과학사.
26) 이정봉, 앞의 글, pp.392 이하.
27) 김정연 외, 앞의 책, pp.41.
1) ‘정문 정책(front - door)’ 전략의 효율적 시행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Blumstein이 제시한 전략 중 ‘정문 정책(front - door)’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가택 구금, 벌금형, 배상 처분, 사회봉사명령 등 비 구금적 제재를 통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수형자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28) 이와 같은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교도소 과밀수용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사회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범죄자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기결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석방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결수용자를 감소시키는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 등 형사사법 정책의 실천이 요구된다.29) 또한 형벌의 가장 큰 제지 효과는 확실성에 있는 것이지 엄중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30) 따라서 지나친 장기 구금은 시간적·금전적·사회적 낭비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의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형벌의 제지 효과는 구금 초기에 가장 크게 발휘되므로 단기형이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3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도소의 과밀현상 보다 구치소의 과밀현상이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교정 당국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
28) 이윤호, 앞의 책, pp.93.
29) 이희정, 앞의 글, pp.14.
30) Franklin E. Zimring & Gordon J. Hawkins, (1976), Deterrence : 「The Legal Threat in Crime Control」,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161.
31) Michael Tonry, (1979), 「Crime and Justice」, pp.257, University of Chicago.
2) ‘후문 정책(back - door)’ 전략의 효율적 시행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Blumstein이 제시한 전략 중 ‘후문 정책(back - door)’으로는 보호관찰부가석방, 외부 통근 등 사회 내 처우,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활용 등을 통해 형기 종료 이전에 출소시키는 것이다.32) 이와 더불어 3개월 미만의 단기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단기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부정하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분류심사에서 제외되므로33) 현실적으로는 가석방의 영역 밖에 놓이게 된다.34) 따라서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단기수형자에게 벌금 등의 대체 형벌이 바람직하고, 충격 구금을 위한 수형의 경우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소년의 경우에만 실시하는 부정기형제도에 대한 재평가이다. 이 제도를 당장 입법에 반영할 필요성은 없지만, 부정기형에 흐르는 입법 정신, 즉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화·개선을 통한 재사회화 추구 이념은 형 집행 과정에서 원용되어야 할 것이다.35)
32) 이윤호, 앞의 책, pp.93.
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72, 2024. 2. 8. 일부개정), 제62조 참조.
34) 김선태, 앞의 글, pp.46.
35) 손동권, (2003), ‘미국의 자유형과 그 대체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pp.425, 한국형사정책학회.
III. 가석방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1. 가석방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1) “개전의 정”에 대한 평가
수형자 중 어떤 자를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가는 가석방제도의 중요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에 대해 형법 제72조 제1항은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5조는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상의 양호”, “개전의 정”,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서 그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36)
실제 가석방심사에서 “개전의 정”에 대한 판단은 반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을 가장 보편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실무에서는 경비처우급,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및 집행률을 고려하여 ‘가석방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의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이다. 이처럼 교화·개선이라는 가석방 대상자 선정의 주요 요인이 내적인 변화이므로 이를 계량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외형적인 요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범죄의 동기나 죄명 등은 이미 형기에 반영되었으며, 보호 관계의 양호 여부(접견, 서신 등), 합의 또는 변제 여부 등은 수형자의 개선 의지와는 무관한 요인에 해당한다.37) 그리고 생활환경 등은 이미 범죄를 저지를 당시 수형자의 여건에 해당하므로 재범의 위험성 지표로써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36) 정진영, (2003), ‘가석방제도와 관련된 제문제의 검토’, 교정연구 제20호, pp.174, 한국교정학회.
37) 이정봉, 앞의 글, pp.24.

2) ‘교정재범예측지표(Co-PEPI : Correction Recidivism Prediction Index)’의 기준
2012년 법무부는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 조기 예측을 위한 평가도구로써 ‘교정재범예측지표(Co-PEPI)’를 마련하였다. 이 지표는 23개 문항과 각 문항에 따른 할당 점수 및 등급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38) 그러나 이 문항들은 본건 및 과거 징벌 횟수, 이전 범죄의 전체 형기, 동일·유사 죄명 경력 횟수, 최초 형 확정시의 나이, 이전 범죄 출소 시의 나이, 학창 시절의 처벌 경험, 입소 전 경제 상태 및 거주상태 등 인구 과학적인 요인에 치중되어 있다.39)
반면 죄명, 범죄시의 정신상태, 과거 징벌 횟수, 이전 범죄 전체 횟수, 동일·유사 죄명 경력 횟수, 재범기간, 집행유예 취소·실효 횟수 등은 이미 선고형에 반영된 지표이다. 따라서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형벌의 가중 요소를 반복하여 반영하는 이중 평가의 위험성이 있다.40) 그리고 저학력자·일용직·동거 횟수가 많은 자는 불이익한 평가를 받게 되므로 인권침해와 차별 그리고 편견이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사항들에 의해 장래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41)
38) 교정재범예측지표(Co-PEPI)는 성별, 죄명, 피해자, 범죄시 정신상태, 본건 및 과거 징벌 횟수, 이전 범죄 전체 형기, 동일·유사 죄명 경력 횟수, 최초 형확정 연령, 재범기간, 이전 범죄 출소 연령대, 집행유예 취소/실효 횟수, 동거 횟수, 학창 시절(18세 이하) 처벌 경험, 범죄시 직업, 입소 전 경제 상태, 입소 전 거주상태, 정신병원 치료 경력, 학력, 출소 후 재범환경,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 요인별 재범 가능성, 교정 심리검사 비행 성향, 교정 심리검사 포기 성향 등 23개 문항이 있다. - 분류처우 업무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39) 김정연 외, 앞의 글, pp.46.
40) 박미랑, (2015), ‘가석방 심사에 있어 재량권과 평가기준에 대한 고찰’, 교정연구 제67호, pp.164, 한국교정학회.
41) 강동범/이강민, (2017), ‘가석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방안’, 교정연구 제27권 제2호, pp.11, 한국교정학회.

2. 가석방제도의 발전 방향
가석방제도는 시설 내 처우에 있는 수형자에 대해, 수형자의 자율 의지에 기초하여 사회 내 처우로 변경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를 통해 수형자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적응을 돕는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42) 따라서 수형자가 사회복귀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특별예방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43) 그러므로 형기 종료가 임박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기보다는 사회복귀 준비가 되어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형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가석방이 가진 원래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44)
더불어 순수한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과 가능성을 항상 보유하고 있다. 특히 수형자는 범죄행위로 인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이다. 따라서 우리 법률이 요구하는 가석방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객관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전의 정”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의 정도는 ‘재범으로 나아가지 않을 개연성이 높은 경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5) 그리고 개선 의지는 수형자가 사회적응 능력과 생계 능력 등을 고취하기 위한 기술의 습득, 작업과 봉사를 통한 근면·성실의 습관, 과학적 지표를 통한 사회에 대한 적대심과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심리적 태도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2) 남선모/이인곤, 앞의 글, pp.240.
43) 정승환/신은영, (2011), ‘가석방의 사법처분화 방안 연구’, 형사정책 제23권 제2호, pp.217, 한국형사정책학회.
44) 이희정, 앞의 글, pp.11.
45) 류병관, 앞의 글, pp.29.
Ⅳ.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활용 방안
가석방의 요건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경우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예측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도소 내의 무조건적인 규율의 준수, 명령의 복종 등 수형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형 집행을 견뎌낸 자가 가석방의 기회를 얻게 된다.46) 따라서 가석방의 요건에 대한 예측의 정형화가 요구되며, 수형자에게 교정시설 내의 처우 프로그램 참여가 강요되지 않아야 한다. 강요에 의한 참여는 성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의 개발이 절실하다. 46) 배종대, (2017), 형법총론, pp.616, 홍문사.
1.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연혁과 의미
형기단축제도는 작업성적, 교정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 교도소 내에서의 선행 등 특별한 공적에 따라 일정 기간의 형기를 단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이전부터 ‘선시제도’라고 불리어졌지만, “Good Time”을 선시(善時)라고 직역함으로써 오히려 의미의 모호성이 더해졌다.47) 이 제도를 통해 단축되는 형기는 수형자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권리로 인정되므로 이를 ‘형기 자기 단축제도’, ‘선행 보상제도’ 또는 ‘선행 감형제도’라고 불리기도 한다.48) 이 제도는 가혹한 정기형의 완화정책으로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에 의해 고안되었고,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미법계 국가와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채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석방제도의 도입으로 쇠퇴하였지만, 가석방제도와 병용되고 있다.49)
우리나라도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가석방제도를 시행하면서 형기단축제도를 폐지하였지만, 해방 이후부터 미군정시대인 1948년 3월 31일 법령 제172호로 ‘우량수형자 석방령’에서 이 제도를 채택한 바 있다.50) 이 제도는 교도소의 수용인원을 조절하고, 선행을 장려하여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유지하며, 교도소에서 생산한 제품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지만, 오늘날은 수형자에게 열악한 교정시설로부터 재사회화를 촉진한다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제도의 방식은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전체 형기에서 감해줄 것인가도 시행하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51) 이 제도를 가석방제도와 함께 운영함으로써 가석방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면, 가석방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7) 이에 따라 이 논문은 “Good Time System”을 ‘형기단축제도’라고 표기한다.
48) 박영규, (2013), ‘선시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정연구 통권 제60호, pp.101, 한국교정학회.
49) 大谷 實, (1987), 刑事政策講義, pp.290, 成文堂.
50) 박영규, 앞의 글, pp.101.
51) John Ortiz Smykla, (1985), ‘Probation and Parole : Crime Control in Community’, pp.108,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 가석방제도와 형기단축제도의 비교·분석
가석방제도와 형기단축제도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가석방제도의 주된 선정 기준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사회의 안전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이지만, 형기단축제도의 주된 선정 기준은 교도소 내의 작업성적·교정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교도소 내의 선행 즉, 근면과 선행이 선정 기준이 된다. 둘째,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선 의사 또는 노력과는 무관한 보호 관계 또는 범죄의 태양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형기단축제도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석방일을 앞당길 수 있다. 셋째, 가석방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을 허용함으로써 시설 내 처우를 사회 내 처우로 변경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형기단축제도는 행정권에 의해 형기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사법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52) 52) 박영규, 앞의 글, pp.102.

3. 외국의 형기단축제도 운영 사례
미국의 경우 48개 주와 콜롬비아 자치구에서 형기단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최초의 선시법은 1817년 뉴욕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법률은 5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초범자를 대상으로 형기의 4분의 1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복역한 형기와 선시로 인해 감형받은 기간이 수형자가 선고받은 기간에 해당할 때 자동으로 석방되는 자동석방제도(mandatory release, 필요적 가석방)를 채택하고 있지만, 뉴욕주와 미주리주에서는 가석방제도에 의해 가석방된 수형자와 형기단축제도에 의해 자동 석방된 수형자 모두 같은 조건에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53)
미국 연방과 대부분 주에서는 법률상 선행점수(Statutory good time) 또는 취득 점수(gain time) 등으로 불리는 ‘모범수 형기 단축 점수’와 공로 선행 시수(Meritorious good time), 노역 시수(Work time) 또는 근로 선행 시수(Industrial good time)라고 불리는 ‘수형 시설의 교육’, ‘근로의 참여’,‘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를 혼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수형 규칙을 준수하고 수형 시설의 근로 방침에 협조적이며 능동적인 근로의욕을 가진 수형자에게 보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54)
그리스의 경우 1952년부터 작업에 의한 수용 기간 단축이 제도화되어 있다. 즉, 6개월 이상의 형에 처한 수형자는 교정시설 외에서 1일의 작업마다 2일간 단축을 그리고 교정시설 내에서 1일의 작업마다 1.5일의 단축을 인정한다. 그러나 작업거부 또는 징벌의 부과가 있으면 단축은 무효가 되며, 가석방은 보호관찰 사항의 중대한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지만, 작업에 의한 필요적 가석방은 취소되지 않는다.55)
스페인의 경우 1982년부터 구류를 포함한 모든 구금에 대해 작업에 의한 수용 기간 단축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2일의 작업마다 1일간 단축을 인정한다. 연간 최대 75일까지 단축을 인정하지만, 가석방과 결합하면 형기의 3분의 1 이후에는 출소가 가능해진다.56)
프랑스의 경우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한 수형자에게 수형 기간을 단축해 주는 모범수에 대한 형기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전(Code de la procédure pénale)의 제4절 감형에 규정되어 있는 감형제도(réduction de peine)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자유형의 경우, 수형자의 행실을 고려하여 형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형집행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재량이 아닌 법관에 의해 감형이 결정된다. 프랑스의 경우, 모든 수형자에게 자신의 형기에 비례한 감형 기간이 사전에 제공되며 행형성적이 좋지 않거나, 악행을 행한 경우, 감형 기간이 삭제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57)
53) James A. Inciardi, (1999), 「Criminal Justice」 6th Edition, pp.550, Alabama Original Materials.
54) 주성빈/윤해성, (2022), ‘수형자의 능동적 사회복귀 정책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2권 제1호, pp.9, 한국정책개발학회.
55) 山下邦也, (1993), 新·刑事政策, pp.280, 日本評論社.
56) 山下邦也, 前揭 書, pp.281.
57) 주성빈/윤해성, 앞의 글, pp.11.
4.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운영 방안에 대한 제언
가석방제도는 법원에 의해 확정된 형기를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해 변경하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주의에 반한다는 제도 자체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가석방제도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을 허용함으로써 시설 내 처우를 사회 내 처우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가석방이 오히려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수형자에 대해 법원이 가석방 판결을 선고하는 ‘사법형 가석방제도’와 프랑스식 법관에 의한 감형은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반면, 외국에서 실시하는 형기단축제도 중에는 보호관찰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형기 자체를 단축하는 ‘형기 자기 단축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법원에 의해 확정된 형기를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해 변경하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뉴욕주와 미주리주처럼 보호관찰을 전제로 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시설 내 처우를 사회 내 처우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가석방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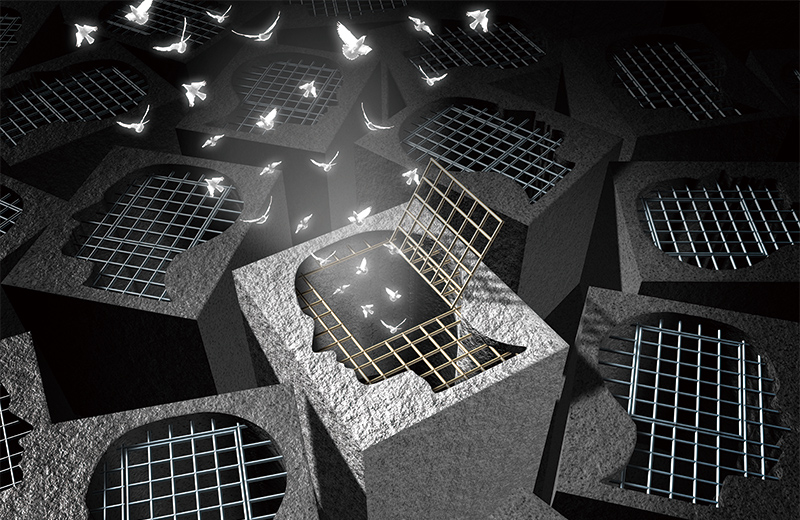
더불어 가석방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가석방적격심사기준’과 ‘교정재범예측지표(Co-PEPI)’를 통해 이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력으로 조기 석방을 쟁취하고자 하는 수형자가 더욱 개선·갱생의 의욕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58) 교정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수형자를 교화·개선하지 못하는 책임은 교정기관의 몫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교활한 수형자가 있음을 경계59)하기보다는 효과적인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형기단축제도로써 가석방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단지 가석방제도의 평가적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형기단축제도의 병용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58) 장영민/탁희성, 앞의 글, pp.191.
59) 박영규, 앞의 글, pp.104.
V. 결론
범죄에 대한 인류의 대책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교정의 이념 또한 변화와 발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전통적인 형벌개념이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함으로써 응보적 기능과 함께 사회 방위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했다면, 현대적 형벌개념은 더 이상 구금이 요구되지 않는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가두어 두는 것은 교화의 기회와 사회적응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할 수형자를 반사회적 인간으로 방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수형자에 대한 교정의 사회화 즉, 사회 내 처우가 중요한 역할로 자리하게 되었으며, 가석방제도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정 환경의 변화와 세계적인 형사정책의 추세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60)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가석방제도는 영·미식의 행정처분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의 조기 석방 방식 중 형기단축제도를 제외한 채 가석방제도만을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있지만, 가석방 대상자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수형자 스스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적극적인 교정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높이며, 봉사활동 등 선행을 통해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이 제도의 비판적 견해 중 교활한 수형자의 악용 가능성은 가석방제도에서도 존재한다. 가석방을 받기 위해 개선된 척 꾸미는 교활한 수형자가 혜택을 보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가석방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듯,61) 형기단축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며,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개선해 가야 할 부작용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형기 단축 인자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첫째, 자격증의 취득 여부이다. 예컨대 토목, 건축, 조경, 용접 등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각종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석방 후 취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수형 시설 내 작업 일수이다. 그리스의 경우처럼 수형 시설 내 1일의 작업마다 1.5일의 단축을 인정하고, 스페인의 경우처럼 한계를 정하여 최대 1년에 73일 즉, 20% 내에서 형기 단축 일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수형 시설 외 작업 일수이다. 그리스의 경우처럼 수형 시설 외 1일의 작업마다 2일의 단축을 인정해야 한다. 시설 내 작업보다 시설 외 작업은 수형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작업을 통해 사회적응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단축 일수를 가산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또한 한계를 정하여 최대 1년에 73일 내에서 형기 단축 일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시설 내 작업 일수와 합산하여 최대 1년에 73일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교정교육의 참여이다. 근로의 참여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정교육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정교육 참여는 형기 단축 인자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형 시설 내 문제를 일으킨 경우, 형기 단축 누적 점수에 대한 삭감이다. 이를 통해 수형 시설 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수형자가 격정범으로 다시 수형자가 될 가능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
60) 이정봉, 앞의 글, pp.392.
61) 배종대/홍영기, (2019), 형사정책, pp.462, 홍문사.

형기단축제도 또한 완벽한 제도라 할 수 없고 내재한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가석방제도와 병용한다면 서로가 가진 단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그 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법률적으로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경과하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형기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즉 1년에 최대 73일까지만 형기 단축을 인정함으로써 가석방제도를 무력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의 엄격한 적용을 조건으로 시행해야 하며, 형기 단축의 취소와 실효제도를 마련해야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와 인식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국내문헌
강동범/이강민, (2017), ‘가석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방안’, 교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교정학회.
교정기획과, (2023), 「2023 교정통계 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김선태, (2017), ‘가석방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교정연구 제27권 제2호 (통권 제75호), 한국교정학회.
김정연 외, (2019),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준성, (2013), ‘가석방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제6권 제3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남선모/이인곤, (2014), ‘현행 가석방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53호, 한국법학회.
류병관, (2019),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제56회 한국교정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법무부.
박미랑, (2015), ‘가석방 심사에 있어 재량권과 평가기준에 대한 고찰’, 교정연구 제67호, 한국교정학회.
박영규, (2013), ‘선시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정연구 통권 제60호, 한국교정학회.
배종대, (2017), 형법총론, 홍문사.
______ 홍영기, (2019), 형사정책, 홍문사.
법무부, (2024), 「2024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손동권, (2003), ‘미국의 자유형과 그 대체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이백철, (2020), 교정학, 교육과학사.
이성호 외, (2017), 「구금시설 과밀수용과 수용자 인권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이윤호, (2021), 교정학, 박영사.
이정봉, (2004), ‘현행 가석방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제24집,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희정, (2021), ‘가석방제도의 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정연구 제31권 제1호 (통권 제89호), 한국교정학회.
장영민/탁희성, (1993), 「가석방의 실태와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승환/신은영, (2011), ‘가석방의 사법처분화 방안 연구’, 형사정책 제2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정윤숙 외, (2023), 「2022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정진영, (2003), ‘가석방제도와 관련된 제문제의 검토’, 교정연구 제20호, 한국교정학회.
주성빈/윤해성, (2022), ‘수형자의 능동적 사회복귀 정책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정책개발학회.
■ 외국문헌
Franklin E. Zimring & Gordon J. Hawkins, (1976), Deterrence : 「The Legal Threat in Crime Control」,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ames A. Inciardi, (1999), 「Criminal Justice」 6th Edition, Alabama Original Materials.
John Ortiz Smykla, (1985), ‘Probation and Parole : Crime Control in Communit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Michael Tonry, (1979), 「Crime and Justice」, University of Chicago.
Peter L. Nacci, Hough E. Teitelbaum, & Jerry Prather, (1977), ‘Population Density and Inmate Misconduct Rates in Federal Prison System’, Federal Probation.
大谷 實, (1987), 刑事政策講義, 成文堂.
山下邦也, (1993), 新·刑事政策, 日本評論社.